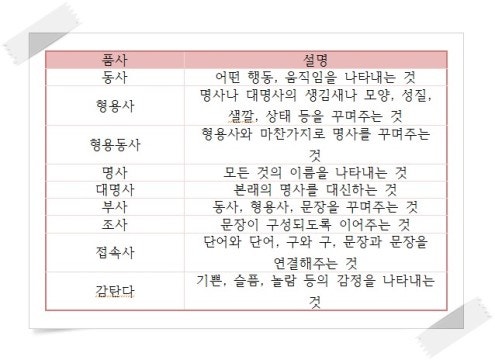♡ 화법에 대하여 – 류시화 저는 22살에 신춘문예에 등단하여 여러 시집으로 명성을 얻었고 가는 곳마다 시인, 작가로 불렸습니다. 나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시인’의 품사는 인생, 사랑, 여행 등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깝다. 명사는 현재 진행형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시를 쓸 때는 시인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인이 됩니다. 나는 시인이 아니다. 다른 작가의 책을 읽을 때 나는 독자가 됩니다. 버스를 탈 때 나는 승객이다. 병원에 가면 나는 환자다. 레스토랑에서 나는 고객이다. 나는 내 연인의 애인이고, 내 아들의 아버지이며, 나와 함께 사는 강아지의 환영받는 주인입니다. 한편, 힌디어에서는 선생님에게는 학생이고, 외국에서는 배낭여행자입니다. 사실 정해진 나란 없다. 이름은 역할에 따른 약속인 명사일 뿐이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이고, 교수는 학생을 가르칠 때 교수입니다. 밖에 나가면 의사입니다. 그 사람도 승객이고 가는 중이에요. 그는 단지 지나가는 행인, 관광객, 손님일 뿐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의사-교수라는 명사로 동일시한다면, 그는 그 정의에 갇히게 되고 존재의 많은 가능성과 역동성을 잃게 됩니다. 인도의 예수회 신부인 안소니 드 멜로(Anthony de Mello)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들려줍니다. 한 여인이 중병에 걸려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녀에게 “당신은 누구요?”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마을 시장의 아내인 쿠퍼 부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나는 남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나는 당신의 직업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남편을 잘 도와주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여성은 알 수 없는 목소리와 대화를 나눈 뒤 병이 나았고,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규정했던 제한된 자아에서 벗어나 좀 더 역동적인 존재로 살기 시작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self)) 이미지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우리는 암에 걸리는 순간 암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암환자로 살다가 암환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암에 걸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암환자’는 다른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불교 승려인 아잔 브라흐마(Ajahn Brahma)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말기암을 앓고 있는 여스님이 있었는데, 그녀의 병실 문에는 ‘방문객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잔 브라흐마는 예외다’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암환자’로만 대하는 게 괴로웠다고 한다. 그녀는 Ajahn이 자신을 암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Azan은 그녀 옆에 앉아 농담을 하며 약 한 시간 동안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는 누군가를 방문할 때 환자가 아닌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썼습니다. 나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는 부당하거나 부당하다고 해석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피해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떠나 명문대를 다녔고, 20대에 한 기업의 CEO가 됐다. 그는 똑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한다. 불행한 어린 시절, 실패한 경험, 상처 입는 옷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늙은 사람’, ‘가진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교수로서의 자아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직을 1년만 하고 평생을 목사로 산다. 비록 롤플레이가 끝나더라도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인’, ‘교수’, ‘의사’, ‘부자’, ‘유명인’은 자신의 존재가 훼손되면 존재도 훼손된다고 믿는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의 자아로 대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이끄는 사람이 ‘나는 스승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자기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 중에도 자신의 ‘명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랫동안 만나온 배우 김혜자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오히려 그녀는 명성을 세상이 입는 거추장스러운 옷으로 본다. 네팔의 산악지대는 스릴 넘치는 곳이다. 버스 지붕에 앉아 한없이 낄낄거리는 순수함, 장발의 사두 앞에 앉아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묻는 순수함, 그것이 나에게 각인된 이미지들이다. 깨달음의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역할을 존재로 착각할 때 공허함이 싹트고, 이 공허함은 더 많은 외적인 것을 낳게 된다. 그것은 가득 차 있어야합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도 빌려야 하고, 권위도 빌려야 하고, 지위도 빌려야 하고, 아름다움까지도 빌려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는 밀짚인형과 같습니다. 사실 존재는 한 가지로 정의되는 것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는 무한히 역동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이 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있고,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이자 동시에 광대한 우주이다. 우리는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고, 빗방울이며, 절벽에 부딪치는 파도이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장식, 모든 소유와 지위를 빼앗아도 우리의 본연의 존재는 거대한 호수처럼 투명하고 우주처럼 역동적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저자)